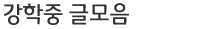“야! 너 노래 한 곡 불러 봐.”
“저 노래 못 하는데요.”
“이 새끼, 군기가 빠져가지고, 너 작곡과 다녔다며?”
“작곡이 전공이지만 노래는 정말 못합니다. 음치라서요.”
순간, 군의관은 말문이 막혔다. 그 때 옆에 있던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럼 너, 한 곡 해 봐.”
그 대목에서 우물쭈물하다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랐다. 벗은 채로 긴장해있는 훈련병들 앞에서, 나 역시 벗은 채로, 첫 소절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런 저 별빛도 외로워라.......”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신체검사장을 서둘러 빠져 나오려는데 상병 하나가
나를 불러 세웠다.
“야, 너 이리 와 봐. 아까 그 노래 제목이 뭐야? 여기 가사 좀 적어 봐.”
그날로부터 그렇게, 조영남의 ‘제비’는 내 ‘18번’, 애창곡 1번이 되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만난 노래 한 곡이 마음에 들어 청계천 레코드 방을 이 잡듯이 뒤졌다. 그리고 드디어 LP판 하나를
구했다.
듣고 또 들으며 내 곡으로 만든 제비, 그것이 입대 전 1978년 봄이었다. 전반 4주, 후반 4주, 훈련소에서의 8주 내내 제비를 몇 번이나 불렀을까? 쉬는 시간이나 교육 중에도 수시로 노래를 시켰다.
“훈병 강 학중 노래 일발 장전!”
“발사!”
자대에 배치 받고도 제비를 참 많이 불렀다. 물론 나보다 훨씬 더 노래를 맛있게 부르던 병사들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인기 가수는 허우석 병장. 이름 때문에 별명이 ‘허부적’병장이던 그는, 모든 노래를 나훈아 창법으로 간드러지게
부르는 재주가 있었다. ‘깊은 산속 옹달샘~’조차 완벽한 나훈아 창법으로 요리를 해 중대원들의 함성을 자아냈다.
허 병장만큼은 아니어도 나의 제비도 인기 신청곡이었다. 인기의 요인은 딱히 모르겠다. 모르는 채로, 시키면 무조건
불렀다.
제대를 하고도, 제비는 늘 나와 함께였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처음 홈스테이를 할 때의 일이다. 멕시코에서 온
여학생이 같은 집에 머물렀었다. 하루는 주인 여자가 피아노를 치고 내가 우리말로 멕시코 민요인 제비를 불렀다.
멕시코 여학생의 눈가가 촉촉이 젖는 것이 보였다.
회사에 입사해서도 나의 애창곡은 제비였다. 노래를 해야할 때가 적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나의 선택은 제비. 그러다보니
언제부턴가 그 좋던 제비가 슬슬 지겨워졌다. 나란 사람은 제비밖에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나 싶었다. 그 때쯤
만난 노래가 조영남의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이다. 밤에 분위기를 잡고 부르면 더욱 어울리는 노래다.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노래로 KBS 명사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다. 그쯤 되니 18번도 슬그머니 바뀌고 말았다.
‘제비’에서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로.
하나의 노래에서 다른 노래로 마음을 옮겨갔지만, 나의 노래 사랑은 더 깊어진 듯 하다. 노래부르기는 내 취미가
되어버렸다. 외출이나 출장 중, 중간에 시간이 비면 주로 서점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서점이 없을 때에는 노래방에
가기도 한다. 하지만 낮 시간에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남자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아이들은 싫어했다. 아내는 더
심하게 말렸다. 영국 유학 시절, 술 한 잔 하고 외로움을 노래로 달래던 청승맞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사랑밖엔 난 몰라요’는 또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줄기차게 부르다 보니 또 내 마음에 좀이 쑤신다.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다. 서영춘의 ‘시골 영감’을 불렀더니 분위기 깬다며 사람들이 말렸다. 나훈아의 ‘갈무리’나
신촌블루스의 ‘골목길’도 다들 내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다.
20년 전쯤이었나? 이젠 가물가물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조영남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초대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가수가 자기 노래에 목이 메는 바람에 밴드가 연주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 곡이 ’모란동백‘이다. 그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선물로 받은 CD의 ‘모란동백’을 틀었다.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첫 소절이 흐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세 번째 18번이 된 모란 동백을 아내도 좋아한다. 휴대폰의 연결음도 모란동백으로 바꾸었다. 조영남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꽤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집으로 두세 번 방문도 했다. 하지만 재능이 너무 많아 노래가 일
순위가 아닌 것이 팬으로서는 안타까웠다.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십 수만 원의 티켓을 사서 입장한
관객들 앞에서 성의 없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곤 콘서트에는 다시 가지 말아야지 했다.
내가 좋아하는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 노사연의 ‘님그림자’,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고 조용필의 ‘들꽃’ 등 다른 애창곡도 많지만 단연코 내 18번과 17번, 16번은 조영남 노래다. 한 남자의 노래를 40년 이상 이렇게 좋아하는 내가 신기할 때가 있다. 조영남씨가 여자였으면 심각한 가정불화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듣고 또 듣고 부르고 또 불러 내 노래로 만든다. 노래에 관한한 나는 ‘노력형’인 걸까? 내 노래를
들어 본 사람은 내가 박자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내가 고백해도 믿지를 않는다.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명사
음악회 무대에도 초대를 받았을 때 잠시나마 노래 레슨을 받기도 했지만 박자와 발성은 여전히 나의 숙제다. 그런데
아내는 레슨 후 오히려 노래 맛이 더 없어졌다고 한다. 노력이 과했던 걸까, 부족했던 걸까?
살아생전 내 18번이 몇 번 더 바뀔지 알 수 없다. 다음 애창곡으로 윤동주의 시에 조영남이 곡을 붙인 ’서시‘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세상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너무나 많다.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또 어떤 노래에 반해버릴지 누가 알랴.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곡들을 만들어내는 작곡가들의 재주가 참으로 감탄스러울 뿐이다.
40여 년 전 훈련소에서 인연을 맺은 ’제비‘가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그리고 ’모란동백‘으로 맥을 잇고 있다.
다음 내 18번은 또 어떤 노래가 될는지.......